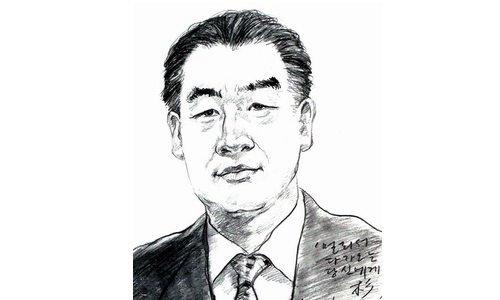
지난달 마지막 한 주,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이 한반도에 집결한 거대한 국제 무대였다. 특히 한미·미중·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이어지며 한국은 잠시 세계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가 됐다.
이번 APEC에서 미국은 동맹의 복원을, 중국은 존재감의 회복을, 한국은 균형 외교를 시도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완벽한 만족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협상에서 일부 성과를 얻었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실질적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APEC은 결국 균형의 외교 무대였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고, 각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무대였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외교력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AI 공급망 협력과 기후 연대 구상에서도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외교의 시간은 길지 않다. 경주에서 외교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정치의 시계가 잠시 멈췄지만, APEC이 끝난 후 한국은 다시 정치의 시간으로 복귀했다. 특히 많은 정치 현안이 있지만, 이 모두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국정감사도 오는 6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감이 끝난다는 건 국회가 정책 감시의 시간을 접고 곧바로 정치의 시간으로 진입한다는 뜻이다. 여야는 이제 법안보다 공천을, 청문회보다 지역 조직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선 APEC이 끝난 후 외교 무대가 정치 무대로 이동했고, 정치 무대는 이제 국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는 APEC보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외교가 국가 간 신뢰를 쌓는 일이라면, 지방정치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일이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평가받은 국가 브랜드가 실제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국가가 세계를 향해 쌓아올린 신뢰와 위상이 과연 지역의 일자리·복지·생활 환경으로 이어졌는지를 국민이 직접 묻는 자리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예산은 줄고, 인구는 감소하며, 지역 소멸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보다 생활 속 결핍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지방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세계 속의 한국보다 생활 속의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APEC 기간 내내 한국의 화두는 ‘연결’이었다. AI 협력,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공급망 안정 등 모든 담론이 연결을 전제로 했다. 이제 그 가치를 국내 정치가 이어받아야 한다.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연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연결이 필요하다.
정치의 언어는 종종 경쟁과 대립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진짜 정치의 언어는 대화와 조율이다. 외교가 상대국의 이해를 조율하는 기술이라면, 지방정치는 주민의 요구를 조율하는 기술이다. 이제 정치가 외교처럼 조율하고 설득하는 언어를 익혀야 할 때다.
APEC 이후의 시간은 전환기다. 세계의 지도자들과 악수했던 손은 이제 국민과 다시 맞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제 무대의 연설자가 아니라, 생활 현장의 청취자가 돼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의 장이 아니다. 균형의 외교를 넘어 균형의 정치로 나아가는 시험대다. 지금 한국 사회는 두 가지 균형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세계와의 균형, 다른 하나는 국민과의 균형이다.
핵잠수함이 보이지 않는 억제력이라면, 지방정치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다. 국제 무대가 국익을 위한 거시적 균형의 공간이었다면, 지방은 삶의 질을 위한 미시적 균형 무대다.
조율하는 외교가 나라의 평화를 지탱하듯, 책임지는 행정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한다. 한국은 외교의 시간에서 이제 정치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무대만 달라졌지 본질은 같다.
그러나 외교 무대에선 하나였던 여야가 정치 무대에선 다시 갈라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