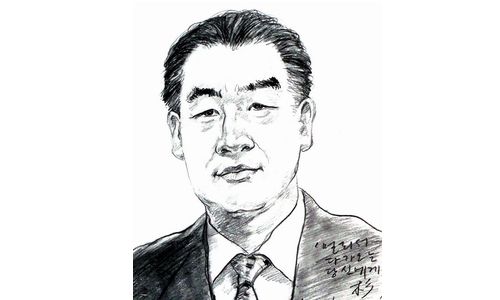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로, 정치 지망생의 등용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주요 지역)의 경우 성과와 존재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과거에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간 예가 많았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지선은 곧 차기 대권 도전 자격을 검증받는 무대로, 일종의 오디션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 역시 ‘지선 성적표’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될 것이다.
‘광역단체장→대통령’의 구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된 광역단체장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지선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오디션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선이나 공천 룰을 정당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당헌에 규정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헌이 아닌 당규로 규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급조한 것처럼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입맛에 따라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물론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한다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 선거에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헌 개헌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서라도 차기 대선, 총선, 지선에선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대통령’의 단계적인 행정 권력 구도와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의 단계적인 입법권력 구도를 당헌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에게 광역단체장 후보 자격을 주고, 광역단체장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을 줘야 행정권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국민과 가까운 행정을 할 수 있고, 기초의원에게 광역의원 후보 자격을 주고, 광역의원에게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줘야 입법권력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단체장(광역의원)을 거쳐 대통령(국회의원)까지 올라가는 구도는 지도자의 행정(입법) 실력과 민생 감각을 단계별로 검증할 수 있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래야 중앙정치 중심의 정치 구도가 바뀌면서 지선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지선도 살아나고 지방 분권시대도 가능하다. 특히 ‘위에서 찍어내린 인물’이 아닌 ‘국민이 키운 인물’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가 선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군사정권과 중앙정부 중심 체제였고, 고시·사법시험·서울대 법대 출신 등이 주로 중앙정부·국회에 진입하는 등 ‘검찰총장, 장관, 국회의원→대권’이라는 엘리트 코스가 고착돼왔다.
지방자치는 1995년에 부활했기 때문에 역사가 짧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 시장·도지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8세기부터 주 단위 자치가 강력했고, 대통령도 사실상 주지사→연방‘ 단계를 밟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를, 조지 W.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를,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독일·프랑스 등도 지방의회·시장 출신이 중앙정치로 자연스럽게 진출해왔다.
우리나라에서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대통령‘ 코스를 밟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성남시장→경기도지사→대통령)이 유일하고,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 코스를 밟은 의원은 송영길 전 의원(부평구의원→인천시의원→국회의원)이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되려면 중앙정치 경력만 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구도에서 벗어나, ‘기초단체장(기초의원)→광역단체장(광역의원)→대통령(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광역단체장(광역의원)→대통령(국회의원)’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정부 재정의 70% 이상이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해 독자적 정책 추진이 어렵고, 교통·복지·교육 등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성과를 낼 수 없다.
유권자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 중앙정치 경력보다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총리나 당 대표했으니 대통령감’이라는 사고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성과를 냈으니 대통령감이나 국회의원감’이라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미국처럼 ‘주지사 성공=대통령 자격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성과를 당 차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고, 경선이나 공천할 때 ‘엘리트 스펙’ 중심에서 ‘실적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계적 자격 제한을 두자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광역단체장(광역의원)→대통령(국회의원)’ 구도가 지선 경쟁을 과열시키고, 정치인이 지역 행정보다 정치적 쇼맨십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훌륭한 장관이나 변호사, 학자 출신 리더들이 단계를 뛰어 넘어 정치에 도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보완하고 극복하면 된다.
며칠 전 만난 L 그룹의 J 부문장은 필자와 대화 중 국회의원도 직선제로 뽑았으니, 최소 3선 이상은 광역단체장처럼 대선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정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광역단체장(광역의원)→대통령(국회의원)’ 구도를 적용하되, 경선이나 공천 때 각각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좋겠다고 했다.
필자도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광역단체장처럼 후보 자격을 준다”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내년 지선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어 단계적으로 후보 자격을 주는 경선·공천 룰을 당헌으로 규정하기 바란다. 그래야 내년 지선에 많은 미래의 인재가 모이고 지선도 흥행할 수 있을 것이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지방시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 다녀왔다. ‘AI 지방정부 구상과 실현을 위한 세미나’였다. 필자는 3시간 이상 세미나를 지켜보면서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지선에 인재를 모이게 하고, 지선을 미래 대통령을 뽑는 오디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