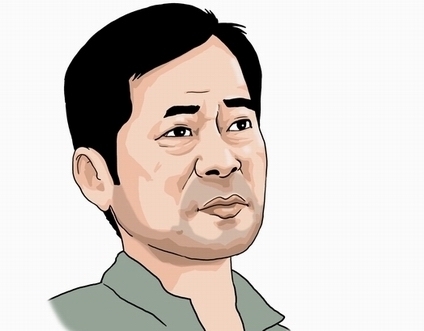
1960년 12월30일의 일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겸무대의 명칭을 청와대로 바꾸기에 앞서 담화를 발표했다.
“경무대는 구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원부(怨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이를 고치려 오랜 기간 힘써왔다. 아울러 지금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고 이조 시대 초엽에 경복궁의 모든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기에 푸른 기와라면 우리 고전문화를 상징할 수 있고, 평화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와대로 개명하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푸른 집(더 블루 하우스)로 통용되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말인즉 청와대는 절대권력 외에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필자를 포함해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강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말이 즉각적으로 떠오른다.
왜냐면 사안의 본질을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다. 37%에 달하는 유권자가 윤 당선인을 지지한 이유는 명백하다.
정권교체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보다는 나은 미래를 희망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를 선택한 게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는 앞서 이야기했듯 희망을 전재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수준에 딱 걸맞게 첫 단추로 지난 역사와 단절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의 사고 얼마나 한심한지 그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
먼저 청와대 존재에 대한 국민들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청와대 내놓으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느냐에 대해서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민 머리 속에 청와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당면한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뿐이다.
다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대목에 대해 살펴보자.
참으로 아연하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독재권력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의 비뚤어진 권력욕이 문제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지금 윤 당선인이 언급했던 이전 비용의 급증 등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저 우스갯소리 한 번 하자. 건물의 명칭과 관련해서다. 혹시 ‘The White House’라 지칭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론적으로 언급하자. 지금까지 청와대가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측면, 지나치게 넓은 부지 그리고 인의 장막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 등은 인정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연장 탓하지 말고 현 집무실과 관저를 한 라인으로 묶어 그 사이를 실용적으로 단장하고 나머지 여타의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청와대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도록 함이 옳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