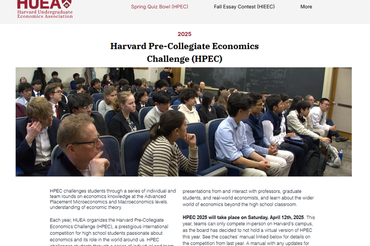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형인 허봉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누나를 찾았다.
아니, 오라버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참석하지 못한 누나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함이었다.
누나를 찾았을 때 역시 방 안에 홀로 앉아 시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누나에게
“누나!”
동생 허균의 손을 잡고 있는 난설헌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눈물이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난 기쁨 그리고 오라버니의 죽음 아울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을 터였다.
“오라버니는 편히 보내드렸니?”
“그래, 누나. 아버지 곁에 나란히 눕혀드렸어. 아마도 저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암, 그래야지.”
허균이 찬찬히 누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말소리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잦아드는 말소리만큼이나 고왔던 얼굴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순간 두렵고 아찔한 생각이 솟구쳤다.
“누나, 힘내!”
“암, 그래야지. 그런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만 마음처럼 그게 쉽지 않구나.”
허균이 누나로부터 손을 빼어 조금 전에 써놓은 듯한 시를 바라보았다.
방바닥에 있는 하얀 한지 위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글이 시선에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구나.
하얀 버드나무 가지에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불은 솔, 오동나무 숲에서 반짝이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며
검은 술 받들어 너의 무덤에 붓는다.
남매의 혼은 서로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좇으며 노닐 거야.
비록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편안히 장성하길 바라겠나
황대사를 읊으며 흐느끼노라
피눈물 슬픈 소리를 삼키노라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紙錢招汝魄(지전초여백)
玄酒尊汝丘(현주존여구)
應知弟兄魂(응지제형혼)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縱有腹中孩(종유복중해)
安可冀長成(안가기장성)
浪吟黃臺詞(낭음황대사)
血泣悲呑聲(혈읍비탄성)
黃臺詞(황대사) : 자식 잃은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일종의 만시(挽詩)
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설움이 복받쳤다. 가슴속에서 피가 끓더니 거꾸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듯했다.
허난설헌,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
누나에게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허균
“누나!”
이번에는 허균이 누나의 손을 잡았다.
막상 누나를 불렀으나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저주스럽도록 몹쓸 놈의 세상만 아니었다면 하는 한탄이 허균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균아!”
“말해봐, 누나!”
설헌의 고개가 옆으로 돌려졌다. 또한 입이 닫혀졌다.
“누나, 말해보라니까!”
허균이 난설헌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오래 살지 못할 듯하구나.”
허균의 타던 가슴이 결국 갈가리 찢어지고 있었다.
누나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이미 누나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어찌하라고!”
난설헌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으나 그 움직임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승에서는 내가 너무 무력해.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
허균의 손이 난설헌의 어깨로 향했다.
그리고 순간 누나의 상체를 끌어당겼다.
누나의 가녀린 몸이 허균의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누나, 안 돼. 먼저 가신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불쌍한 내 오라버니…….”
자신을 끔찍이도 애지중지했던 오라비 허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 그 오라버니였다.
허균의 이야기를 듣는 매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균이 매창이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매창의 어깨를 힘주어 안았다.
그 가슴 안에서 매창이 울고 있었다.
그랬다.
허균은 자신의 흘러내리는 눈물을 매창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 허균이 가슴에 안겨 있던 매창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리, 그리고 누님께서는 세상을 달리 하신 것인가요.”
아직도 슬픔의 기색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렇소. 그렇게 나의 누나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그렇게 나의 친형제인 허봉 형님과 누나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오.”
“참으로 묘한 일이옵니다.”
매창이 눈물이 어려 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이 말이오?”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물어 보이니 말입니다.”
허균이 매창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거리듯 매창의 눈 속에서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
“모름지기 서로의 궁합이 맞아도 인간사 해로는 하늘의 뜻이거늘. 세상과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면…….”
“왜요, 나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물론 매창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말이오.”
“나으리!”
허균의 손이, 눈길이 자연스럽게 매창의 볼로 향했다. 손에 닿은 볼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허균은 그 손길에서 자신의 누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매창의 고운 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