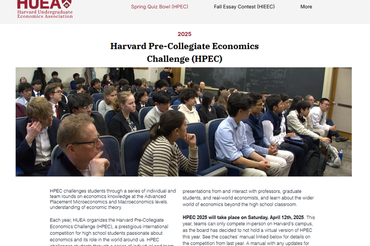여야가 ‘낙천자 경계령’에 휩싸였다.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돼 가면서 낙천한 이들의 ‘돌발 행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낙천자 중 상당수는 무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감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무소속 출마자들이 ‘연대’를 형성할 기미마저 포착되고 있어 각 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명 한명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지 몰라도 ‘뭉친’ 이들은 예상외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천자들이 ‘보이지 않는 적’이 된 경우는 상대가 더 힘들다. ‘카더라’식 소문을 흘리는 것은 물론 감사원, 언론에 공천자의 비리를 은근슬쩍 제보하는 것으로 공천자를 공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아예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으로 가려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천방안이 나오고 시·도마다 차이를 두다보니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기준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출마만 하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선 각 당의 텃밭의 경우 공천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분석했다.